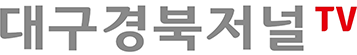홈
오피니언
홈
오피니언
[砥柱中流7] 쇄국(鎖國)과 청년들의 자신감
쇄국(鎖國)과 청년들의 자신감
-소설가 정완식
요즘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진 상태이다. 2018년 김명수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후, 일본 기업들에 대한 자산 압류 판결이 나왔다. 이로부터 지소미아 파기, 화이트 국가 배제 조치들로 양국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어 국내에서 대규모의 반일 물결에 휩싸였다. 심지어 학생들이 일본산 볼펜을 거두어 폐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통령은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말하고,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부르짖으며 반일의식에 기름을 부어 반일에 소극적인 사람들을 ‘경제침략에 굴복 한다’거나 보수 세력을 ‘토착왜구’로 몰아붙이며 국민 의식을 자극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국정원장이 교섭을 맡아 일본에 갔지만 싸늘한 대접만 받고 돌아왔다. 양국관계는 앞으로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는 나라는 쇄국(鎖國)의 길을 걷는다. 왜구 침략을 방지하려고 명나라는 금해령(禁海令)을 발포하고 이를 이어받은 청나라는 반청복명 세력과의 연계를 방지하기 위해 천계령(遷界令)·금해령을 시행했다. 해안으로부터 30리 이상으로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해안을 봉쇄하며 무역을 엄금했다. 그 결과 대항해 시대의 개척활동에 나선 서양에 비해 최대 강국이라던 중국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편전쟁에서 변변한 싸움 한 번 못해보고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만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이나 조선 말기의 사정을 생각해보자. 쇄국의 가장 큰 원인은 열등감 때문이다. 정권 유지에 급급한 집권자는 외국과의 관계에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버린다. 어디에 국익이 있단 말인가?
삼성이 중국의 스마트폰 공장을 철수해 인도로 옮겨가고 있다. 정치가 경제를 좌우할 때 나라의 신용도는 급격히 하락한다. 북한의 개성공단이나 중국의 해외투자 공장은 결국 공산당의 결정에 따라 좌우된다. 까딱하면 투자금 회수는커녕 통째로 기업을 빼앗길 위험도 도사린다. 이런 나라에 과연 어느 자본이 투자할 것인가? 국내에 있는 외국자본을 압류하고 반일 여론을 드높이며 그것이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만 외친다.
반일과 죽창의 기치 뒤에서 일부 세력은 독립운동가로 착각할 만큼 위안부 소녀상을 전국 곳곳에 세우고 나비 모양을 한 뱃지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다. 의혹이 산더미 같지만 후원금이 옳게 사용되었는지 재판도 열리지 않는다. 관련된 사람은 자살했지만 주모자는 당당하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 좌파 일부들에게 ‘민족’이란 말은 과감한 투자개념으로 손색이 없다. 간판에 양머리를 그려 넣고 개고기를 파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민족이란 말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 일본은 전자제품의 선두주자였다. 히타치, 마쓰시타, 소니, 도시바, 산요, 파나소닉 같은 기업들은 이름만으로도 주눅 들게 했다. 1989년 NEC, 히타치, 도시바가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상위 3개사를 석권하고 1990년에도 톱10 기업 중 6개가 일본 회사였을 정도였다. 그러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탓에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삼성, LG가 그 위치를 대신했다.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날들에 걸쳐 고민과 연구를 했으랴. 피하지 않고 당당히 부딪혀 승리하는 길이 민족 자존심을 세우는 길이다.
서울대·카이스트 등 18개 대학의 원자력 전공생으로 이뤄진 녹색원자력학생연대라는 단체가 붙인 대자보에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서 ‘평가 보고서가 조작’됐다고 말한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 서울대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라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제 젊은 학생들도 깨닫고 있는 모양이다. 그들의 자신감이 든든하다.
“다시는 지지 않겠다”던 집권자와 나라를 국제사회에서 믿지 못할 나라로 만든 무능한 외교 당국자는 청나라의 우둔한 황제들이나 쇄국정책을 폈던 정치가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다. 지금은 제법 양복을 차려입고 근엄한 척하지만, 역사의 서슬 푸른 칼날을 피해갈 수 있을까?
*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견해이며, 지비저널의 편집 방향과는 관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