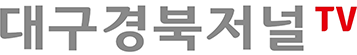홈
오피니언
홈
오피니언
[砥柱中流18] 소의 해를 맞는 몇 가지 단상
소의 해를 맞는 몇 가지 단상
-소설가 정완식
올해는 설날도 지났으니 음력으로도 신축년에 완전히 들어섰다. 게다가 절기도 벌써 우수도 지나 봄비가 내리니 성급한 꽃망울이 이마를 내미는 시절이다.
소는 우리 민족과 함께 땀을 흘리며 일해온 가축이며 식구라고는 하지 않지만 생구라고 부르며 거의 가족처럼 살아왔다. 그렇다 보니 설화나 동화, 전설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동물이 소이다. 전설이 대개 그렇듯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부분이 드물다.
구미에는 두 번의 의로운 소가 등장한다. 산동면 인덕리의 의우총이 대표적이다. 인덕리에 사는 김기년이 집에서 기르던 소와 함께 밭을 갈던 중 호랑이의 습격을 받았다. 소가 주인을 대신해 호랑이와 맞섰다. 그는 소의 방어로 목숨은 구했지만 상처가 무거워 20여 일 뒤 숨을 거두었다. 죽으며 소를 팔지 말고 수명이 다해 죽으면 자기 무덤 옆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소도 먹이를 먹지 않아 주인을 따라 사흘 만에 죽었다. 의우총은 대로변에 쓸쓸히 올봄에도 풀꽃을 피울 것이다.
또 하나는 봉곡동의 이름 모를 소무덤이다. 봉곡동 과부 밀양 박씨는 새끼를 낳고 죽은 암소의 송아지를 자식처럼 키웠다. 자식처럼 보살피다 가난 때문에 개령의 농부에게 팔았다. 몇 해가 지나고 박씨가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다. 장려를 지내는 날, 출발하려는 상여 앞에 암소 한 마리가 달려와 눈물을 흘리니 어미 잃은 자식 같았다. 그러다 암소도 죽고 말아 주인 무덤 아래 장사지냈다. 개령으로 팔려간 소가 30리를 달려 키워준 어머니를 보려고 왔던 것이다. 1866년에 선산부사 김병우가 의우총이란 비를 세웠다.
자신을 키워준 지난 세대를 수구라고 놀리는 세태에야 어찌 이해할 수 있을 이야기일까.
진주는 소싸움이 고장이다. 요즘은 진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싸움소들을 키운다. 싸움소를 키우는 주인들을 만나보면 소를 자식처럼 여긴다. 진주의 어느 주막 여주인이 송아지를 샀는데 너무 사나워 사람을 떠받는 사고뭉치였다. 여주인이 차분해지라고 쓰다듬기를 2년이나 했더니 궁둥이에 털이 닳아 없어져 버릴 즈음 양처럼 순해지더라고 했다. 그 소를 소싸움꾼 강모 씨가 한눈에 알아보고 데려와 첫 출전에서 챔피언이 되었다. 실제 그 주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다.
요즘은 공격형의 옥뿔을 가장 선호하는데, 과거에는 뿔의 생김새를 가리지 않고 성격과 생김새만 보고 선발했다. 어차피 힘센 놈은 끈기없기 마련이고, 뿔이 방어적으로 생긴 놈은 악착같이 버티는 법이니 제 팔자대로 싸우면 되는 것이다.
1970년대에는 상아탑을 자조적으로 우골탑이라 불렀다. 송아지를 사서 키워 팔아 대처의 아들 학비를 댔기 때문에 소의 뼈를 쌓아 대학교육을 받았다는 것이다. 소를 팔아 등록금을 보따리에 싸서 올라간 아버지가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 불고기를 사주며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지만 정작 자신은 못 먹는다. 마음속에는 혹시 팔려간 그놈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예전에 도살장은 역 뒤 중앙스포츠에서 서쪽으로 얼마쯤 떨어진 아파트가 많은 곳의 벌판에 흙담을 두른 외딴집이었다. 거기서 어린 시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살장면을 보았다. 참 마음 아팠던 점은 소가 아직 어린놈이기 때문이다. 그 후 고기를 잘 안 먹었고, 지금도 소고기는 그리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한국인의 마음에 들어있는 소의 인상이 그렇게 시킨 것일지 모른다.
*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견해이며, 지비저널의 편집 방향과는 관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